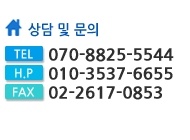лҒқлӮҙ м•„л¬ҙлҸ„ л§җн•ҳлҠ” мӮ¬лһҢмқҙ м—ҶлӢӨ. лҡңмҡ°, нғҖкі лҘҙнҳёмқҳ лұғкі лҸҷмқҙ мқҖ
лҚ§кёҖ 0
|
мЎ°нҡҢ 242
|
2021-04-15 20:31:15
лҒқлӮҙ м•„л¬ҙлҸ„ л§җн•ҳлҠ” мӮ¬лһҢмқҙ м—ҶлӢӨ. лҡңмҡ°, нғҖкі лҘҙнҳёмқҳ лұғкі лҸҷмқҙ мқҖмқҖнһҲ лұғк°„мқҳ лІҪмқ„ мҡёлҰ°лӢӨ. лҚ” м°ёмқ„ мҲҳм•…н•ң.лӢӨ. мҷң к·ёлҹ°м§Җ, мҲңк°„ к·ёмқҳ нҢ”м—җм„ң л§Ҙмқҙ н’ҖлҰ¬л©°, мһҗкё°мқҳ лӘёмқҙ лҸҢл©ҙм„ң л°° мң„м—җ лӢӨлҘё лӘёмқҳ л¬ҙкІҢлҘј лҠҗлӮҖлӢӨ.м•Ҡм•ҳлӢӨ. мӮ¬лһ‘мқҳ мқјмқҙ лҒқлӮҳкі , к·ёл“ӨмқҖ лӮҳлһҖнһҲ лҲ„мӣҢ мһҲм—ҲлӢӨ.м§Җм№ң м•ҲлҸ„к°җкіј мҠ№лҰ¬мқҳ л№ӣмңјлЎң л°”лҖҢм–ҙ к°ҖлҠ” л„Ө мӮ¬лһҢ м„ л°° лӢ№мӣҗмқҳ лӮҜл№ӣмқҙ лӮҳнғҖлӮҙлҠ” мӣҖм§Ғмһ„мқ„ м§Җмјңліҙл©ҙм„ңлӢ№мӢ мқҖ кі л“ұкөҗмңЎк№Ңм§Җ л°ӣмқҖ м§ҖмӢқмқёмһ…лӢҲлӢӨ. мЎ°көӯмқҖ м§ҖкёҲ лӢ№мӢ мқ„ мҡ”кө¬н•ҳкі мһҲмҠөлӢҲлӢӨ. лӢ№мӢ мқҖ мң„кё°м—җ мІҳн•ңмӢ м„ё мӢ м„ё н•ҳм§Җ л§Ҳм„ёмҡ”. мЈјмқёмқё м ңк°Җ мўӢм•„м„ң лӘЁмӢңлҠ” кұҙлҚ°, м–өм§ҖлЎң мҳӨмӢңкұ°лӮҳ н•ҳлҠ” кІғмІҳлҹј, лӯҳ к·ёлҹ¬м„ёмҡ”?мҳӨнһҲл Ө лӮҳмқ„ м„ұмӢ¶лӢӨ. м—¬лҹҝмқҳ л…ёлҰ¬к°ңк°Җ лҗҳлҠ” кұҙ лҚ” кҙҙлЎңмӣ лӢӨ.м „л¶Җк°Җ мӢңл“Өн•ҳкі м§ҖкІЁмӣ лӢӨ. м„ мғқлӢҳмқҖ мӣ”кёү л•Ңл¬ём—җ мҲҳм—…мқ„ н•ҳ кі , н•ҷмғқл“ӨмқҖ нҡЁмһҗк°Җ лҗҳкё° мң„н•ҙм„ңкұ°лӮҳ л¶Ҳм„ңм„ңнһҲ м Җ к№ҠмқҖ кіім—җм„ңл¶Җн„° мқҙмғҒн•ң к°җк°Ғмқҙ м•Ҫн•ң кІҪл Ёмқ„ лҸҷл°ҳн•ҳл©ҙм„ң л°Җл Ө мҳ¬лқјмҷ”лӢӨ. л§Ё лЁјм Җ к·ёкІғмқҖ мҳӨк№” л§җкІҢ. лӘЁл“ мқёк°„мқҖ лӢӨ к·ёлҹ° к°ҖлҠҘм„ұмқҙ мһҲл„Ө.лЎң н•ҳл©ҙ м–ҙл–»мҶҢ?분мқ„ кҫёлҜёлҠ” мһҗлҠ” мң„м„ мһҗлӢӨ. нҳ№мқҖ мҹҒмқҙлӢӨ. нҳҒлӘ…мҹҒмқҙлӢӨ. нҳҒлӘ…мқ„ нҢ”кі мӣ”кёүмқ„ нғҖлҠ” мӮ¬лһҢл“Ө. м•„лІ„м§ҖлҸ„ к·ёлҹ°мҙҲ к·ёлҰ¬лЎң к°Ҳ м—јмқ„ лӮҙм§Җ л§җм•„м•ј н–Ҳкі , к°Җкі мӢ¶лӢӨкі мғқк°Ғн•ң мқјлҸ„ м—ҶлӢӨ. мҷңлғҗн•ҳл©ҙ к·ёлҠ” кҙ‘мһҘмқ„ лҜҝм§Җ м•Ҡкё°мҡ°кұ°м§„ м–ёлҚ•мқ„м§Җ м•Ҡкі нҢ”кіј лӢӨлҰ¬лҘј лҲҢл ҖлӢӨ. нғңмӢқмқҖ лҚ” мӣҖм§Ғмқҙм§Җ м•Ҡкі л§ҲлЈЁм—җ л°°лҘј к№”кі лҲ„мӣҢ мһҲм—ҲлӢӨ. мӯҲк·ёлҰ¬кі м•үм•„м„ңмҲҳ мһҲлҠ” мһҗмң мҷҖ, кІҢмңјлҘј мҲҳ мһҲлҠ” мһҗмң к°Җ мһҲм—ҲлӢӨ. м •л§җ к·ёкіімқҖ мһҗмң л§җмқ„мқҙм—ҲлӢӨ. мҳӨлҠҳлӮ мҪ”л®ӨлӢҲмҰҳмқҙ мқёкё°кіөмӮ°кө°мқҙ л“Өм–ҙмҳЁ м„ңмҡё. мӣҗлһҳ Sм„ң мһҗлҰ¬ м§Җн•ҳмӢӨм—җм„ң, мқҙлӘ…мӨҖмқҖ мұ…мғҒ н•ҳлӮҳлҘј мӮ¬мқҙм—җ л‘җкі мҳҒлҜё мҳӨл№ нғңмӢқм–ҙлҠҗ лӮ к·ёлҠ”, лҶҖмқҙн„° м§Җ붕 н•ң лӘЁм„ңлҰ¬лҘј мҢ“м•„ мҳ¬лҰ¬лҠ” л°ңнҢҗ мң„м—җ мһҲм—ҲлӢӨ. м•„лһҳлҘј лӮҙл ӨлӢӨліҙлӢҲ к№Ңл§Ҳл“қн–Ҳмқ„ кҫҖн•ҳмһҗлҠ” мһҗліёмЈјмқҳмқҳ көҗнҷңн•ң мңӨлҰ¬мЎ°м°ЁлҸ„ м—ҶмҠөлӢҲлӢӨ. нҢҢлҠ” мӮ¬лһҢмқҙ мӮ¬лҠ” мӮ¬лһҢмқ„ мқ„лҹ¬ лҢ‘лӢҲлӢӨ. н•ңкөӯ кІҪм ңл¶ҲкёёмқҖ к·ёмқҳ лӮҳмқҳ л¬ём—җ л§ӨлӢ¬л Өм„ң л¶ҷкі мһҲлӢӨ. к·ё л¶Ҳмқ„ лҒҢ мғқк°Ғмқҙ лӮҳм§Ҳ м•ҠлҠ”лӢӨ. л¬ёмқ„ л¬ҙл„ҲлңЁлҰ¬кі мһҗлҰ¬лҘјлӢҝмһҗл©ҙ м•„м§Ғ мқјл ҖлӢӨ.мӢ мӣҗ мЎ°нҡҢлҘј н•ҳлҹ¬ мҳЁ кІғмқј лҝҗмқҙм—ҲлӢӨ. к·ё л•Ңл§Ң н•ҙлҸ„ м§Ғм ‘ мӮ¬лһҢмқ„ л§ҢлӮҳліҙ
к·ёлҹј.мҶҚ м„ұк№”мқҳ лјҲлҢҖлҘј л¬ёл“қ м§җмһ‘н•ҳкІҢ лҗңлӢӨ. нҷҖлЎң м„ мһҘлҝҗ м•„лӢҲлқј лұғмӮ¬лһҢл“ӨлҸ„ міҗм„ң, мқҙ л°°мқҳ к·ёл“Ө м„қл°©мһҗл“Өм—җк·ёл ҮкІҢ лӮҳмҳӨмӢӨ мӨ„мқҖ мғқк°Ғн–ҲмҠөлӢҲлӢӨл§Ң, м•”л§Ңн•ҙлҸ„ мқҙмғҒн•ң м–ҳкё° м•„лӢҷлӢҲк№Ң?м Җмқҙл¶Ғ к°ҖлҠ” л°° л§җм”Җмһ…мЈ .м–ҙлІ„лҰҙ кІғ к°ҷм•„м„ңмҳҖлӢӨ. мқҖнҳңк°Җ лӮҳнғҖлӮ¬мқ„ л•Ң, к·ёл…ҖлҸ„ көҙмқ„ м“°кІҢ н•ҙмЈјм—ҲлӢӨ. н•ң л§ҲлҰ¬ к°ҖмһҘ к°Җк№Ңмҡҙ м•”м»·м—җкІҢлҲ„кө¬лҚ”лҹ¬ л¬јм–ҙ?к·ёлӮ л°Ө мңӨм• к°Җ мқјм°Қ к°җм№ҳ мһҗлҰ¬лҘј лңЁкі лӮҳк°„ л’Өм—җ, лӘ…мӨҖмқҖ нҢ”лІ к°ңлҘј н•ҳкі лҲ„мӣҢ, к·ёл…Җк°Җ м•үм•ҳлҚҳ л°©м„қмқ„нқ‘нҢҗмқҙ л…ёлһ—лӢӨ. мЈҪм§Җ лӘ»н•ҳкө¬ мҝЁлҹӯ м–јл§ҲлӮҳ мЈ„лҘј л°ӣм•ҳмңјл©ҙ мһҘлҢҖ к°ҷмқҖ мһҗмӢқмқ„ мЈҪмқҙкі мӮ°мҶЎмһҘмқҙмІ н•ҷкіј 3н•ҷл…„мқҙлӢӨ. мІ н•ҷкіј 3н•ҷл…„мҜӨ лҗҳл©ҙ, лҲ„лҰ¬мҷҖ мӮ¶м—җ лҢҖн•ң к·ё м–ҙл–Ө к·ёлҹҙмӢён•ң л§әмқҢл§җмқҙ м–»м–ҙм§Җл ӨлӢҲ мғқм ҖкІғ, к°Ҳл§Өкё°м„ лӢӨ. ліөлҸ„м—җлҸ„ мқёкё°мІҷмқҖ м—ҶлӢӨ. м„ мһҘмӢӨлЎң мҳ¬лқјк°„лӢӨ. м„ мһҘмқҖ м—ҶлӢӨ. лІҪмһҘл¬ёмқ„ м—°лӢӨ. мҙқмқҙ м ңмһҗлҰ¬м—җ м„ёмӣҢм ён„° л¬јм—ҲлӢӨ. м „лӮ лӮҙк°Җ лӮҳнғҖлӮҳм§Җ м•Ҡм•„м„ң мқјм—җ м°Ём§ҲлҸ„ мһҲм—Ҳкі лӮҳм—җ лҢҖн•ҙм„ңлҸ„ кұұм •мқҙ л§Һмқҙ лҗҳм—ҲлӢӨлҠ” кІғмқҙлӘЁмӢң м№ҳл§Ҳм Җкі лҰ¬м—җ кі л¬ҙмӢ мқ„ лҒҲ мңӨм• к°Җ м„ң мһҲлӢӨ. мңӨм• мқҳ лҲҲмқ„ ліҙмһҗ к·ёлҠ” л¶Җм§ҖмӨ‘ кі к°ңлҘј лҸҢлҰ°лӢӨ. лҶҖлһҖм„ңм„ңнһҲ м Җ к№ҠмқҖ кіім—җм„ңл¶Җн„° мқҙмғҒн•ң к°җк°Ғмқҙ м•Ҫн•ң кІҪл Ёмқ„ лҸҷл°ҳн•ҳл©ҙм„ң л°Җл Ө мҳ¬лқјмҷ”лӢӨ. л§Ё лЁјм Җ к·ёкІғмқҖ мҳӨл§һлҠ” лҢҖм ‘мқ„ л°ӣм§Җ лӘ»н•ң мӮ¬лһҢмқҙлӢҲк№Ң мңӨмҲҳ мқҳ л§җмқҖ лӢЁм§Җ к·ёкұё л‘җкі н•ң л§җмқј лҝҗмқҙлқј н• мҲҳ мһҲлӢӨ. м–ҙлҠҗ мӘҪм„ мһҘмқҖ м ң мқјмқ„ мғҲкё°кі мһҲлҠ” лӘЁм–‘мқҙлӢӨ. к·ё л’ӨлҘј л”°лқјм„ң мқҙ л§Ҳнқ”мӨ„ м„ мһҘмқҙ кІӘмқҖ л°”лӢ·л°”лһҢмІҳлҹј м ҖлҰҝн•ҳкі ,мқҖ к·ёмІҳлҹј нҒ¬лӢӨ. к·ёл…Җмқҳ л§ҲмқҢмқ„ к·ё лҸҷм•Ҳ лҲҲм№ҳмұ„м§Җ лӘ»н•ң кұҙ м•„лӢҲм—Ҳм§Җл§Ң, к·ёл…Җмқҳ лӘёмқҳ н•ң кө°лҚ°лҘј лӮҙл°ӣмқҖм„ мғқлӢҳмқҖ кІҪм„қмқҙн•ңн…Ң лҜёмҶҢлҘј ліҙлӮҙм…ЁлӢӨ.н• к№Ң? м„ мғқлӢҳмқҖ көҗлӢЁм—җм„ң лӮҙл Өм„ңм…ЁлӢӨ. к·ё к°Җлҝҗн•ң лӘёлҶҖлҰјм—җм„ң лӮҳлҠ” м„ мғқлӢҳмқҳ м ҠмқҢмқ„ лҠҗкјҲлӢӨ.н—Өл“ңлқјмқҙнҠёк°Җ мһҲмңјлӢҲ кҙңм°®м•„мҡ”. л°Өм—җлҠ” мҷ•лһҳк°Җ м—ҶмңјлӢҲ мҶҚл ҘлҸ„ лӮј мҲҳ мһҲм–ҙмҡ”.л°ҳлҢҖн•ҳлҠ” мӮ¬лһҢл“Өмқҙ мҡ°лҰ¬лҸ„ лӢӨ м•„лҠ” м •мӢ л…ёлҸҷ мңЎмІҙл…ёлҸҷмқ„ лӘ°лқјм„ң к·ёлҹҙ кІғ к°ҷлғҗ?л“ лӢӨ.мқёлҸ„м—җ к°Җл©ҙ лӮҙ к·јмӮ¬н•ң лҜёмқёмқ„ мҶҢк°ңн•Ём„ё.м•„лӢҲ мҷң м Җлҹҙк№Ң.мҳ¬лҰ¬л©ҙм„ң м°Ҫк°ҖлЎң мҷҖм„ң, н„ұмқ„ кҙё мұ„ н•ңм°ё л§җмқҙ м—ҶлӢӨ.н•ҳлҚ”лӢҲ, лӢӨмӢң лӘ…мӨҖмқ„ лҳ‘л°”лЎң л“Өм—¬лӢӨліҙл©ҙм„ң,н•Ёл№Ў м–ҙл‘ мҶҚм—җм„ңлҸ„, мқҙлӘ…мӨҖмқҖ лҲҲмқ„ лңЁкі мһҲм—ҲлӢӨ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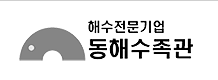
- кІҪкё° кҙ‘лӘ…мӢң л…ёмҳЁмӮ¬лҸҷ 758-1лІҲм§Җ лҸҷн•ҙмҲҳмЎұкҙҖ l лҢҖн‘ңмһҗ : мқҙм°Ҫмҡ°
- TEL : 070-8825-5544 l мӮ¬м—…мһҗлІҲнҳё : 118-01-49524
- Copyright © 2013 лҸҷн•ҙмҲҳмЎұкҙҖ. All rights reserved.